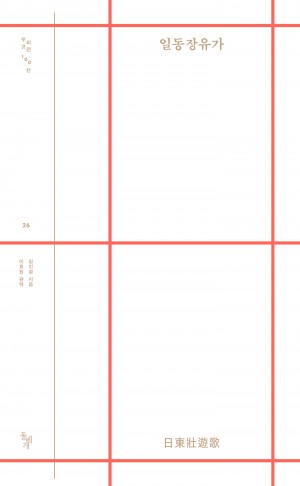일동장유가(우리고전100선 26)
| 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
|---|---|
| ISBN | 9791194442103 04810 |
| 면수 | 264쪽 |
| 판형 | 변형판 135x220, 소프트커버 |
| 가격 | 18,500원 |
| 분류 | 우리고전 100선 |
조선 선비가 본 일본과 일본 사람들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는 조선 후기 외교 사절로 일본에 갔던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이 일본에서 겪은 일을 한글로 쓴 가사 작품이다. ‘일동’(日東)은 일본을 뜻하는 말이고, ‘장유’(壯遊)는 큰 뜻을 품고 멀리 여행을 떠난다는 의미이다. 김인겸은 11개월간의 일본 사행 기록을 8천여 구의 장편 한글 가사로 남겼는데, 작품의 풍부한 내용과 치밀한 서술, 빼어난 장면 묘사는 조선 후기 가사가 도달한 새로운 경지를 보여 준다.
일본의 자연환경과 발전상에 감탄하며 조선을 위해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는 실학적인 면모를 보임과 동시에 임진왜란 등을 겪으며 일본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며 교화와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이 글 곳곳에서 읽힌다.
이 책은 여행의 전 과정 중에서 국내의 이동 기록은 빼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는 장면부터 쓰시마에서 부산으로 귀국하는 장면까지의 여행의 주요 부분을 번역하고 해설을 달았다. 시가의 리듬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옛말을 최대한 남기되, 이해하기 어려울 때만 현대 우리말로 번역했다.
한글 여행기의 백미 『일동장유가』
작가 김인겸(金仁謙, 1707~1772)이 ‘통신사’로 일본에 간 때는 1763년, 영조 39년이다. 김인겸은 안동 김씨 명문가의 후손이지만, 할아버지가 서자였기에 늘 신분의 제약이 그를 따라다녔다. 늦은 나이인 47세에 사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비주류였다. 이런 김인겸이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763년의 통신사행이다. 1763년이 계미년이므로 이때의 사행을 ‘계미사행’이라고도 부른다. 김인겸은 종사관 김상익의 서기(書記)로 발탁되어 장장 11개월에 걸쳐 일본을 여행하였고, 이때의 경험을 8,243구의 한글 장편 가사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 『일동장유가』이다.
조선 시대에 일본에 파견한 외교 사절을 통신사(通信使)라 하고, 이들이 남긴 여행기를 ‘통신사행록’이라 하는데, 이 여행기들 중에 한글 작품은 남용익(南龍翼)의 『장유가』(壯遊歌)와 이 책 『일동장유가』 단 두 편만 전한다.
『일동장유가』의 풍부한 내용과 치밀한 서술, 빼어난 장면 묘사는 조선 후기 가사가 도달한 새로운 경지를 보여 주는데, 여행 도중 겪은 온갖 일과 갖가지 사물, 다양한 인간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빼곡히 담겨 있다. 또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표현이나 인물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어 당시 외교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자들은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김인겸은 거친 바다에서 느낀 두려움이나 여행 도중 홀로 남겨진 당혹감, 일본의 발전상에 대한 질투심, 전쟁의 원흉이라는 적개심 등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신변잡기나 감상에 치우친 것은 아니다. 풍요로운 물산, 발달한 기술, 화려한 도시의 정경, 다양한 인간 모습 등 일본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일동장유가』는 주관적인 감상과 객관적인 서술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독자는 『일동장유가』를 읽으면서 우리말로 된 가사의 묘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를 살았던 한 조선 선비의 일본에 대한 복잡한 시선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양가감정, ‘내가 본 일본’
보수적인 유학자 김인겸은 일본이 마뜩잖았다. 임진왜란을 정점으로 조선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노를 넘어 혐오에 가까웠다. 게다가, 당시 일본은 중국의 발달한 문화와 학문을 직접 수용하지 못했기에, 조선 문인의 글에서 일본은 문명의 교화가 미치지 못한 야만국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김인겸 또한 작품 곳곳에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비추지만, 그래도 한문과 유학을 익혀 진심으로 교류하고자 했던 당대 일본 문사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통신사의 의관(衣冠)과 쓰시마 도주와 승려들의 의관을 비교하면서 도깨비처럼 괴상하다고 쓰고, 쓰시마의 집들이 노적 더미처럼 볼품없다고 기록한 김인겸은 대도시 오오사카에 도착하고 나서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일본의 번영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묘한 질투심을 느낀다.
우리나라 도성 안은 / 동에서 서에 오기
십 리라 하지마는 / 채 십 리가 못 하고서
부귀한 재상들도 / 백 간 집이 금법(禁法)이요
다 모두 흙 기와를 / 이었어도 장(壯)타는데
장할손 왜놈들은 / 천 간이나 지었으며
그중의 호부(豪富)한 놈 / 구리 기와 이어 놓고
황금으로 집을 꾸며 / 사치하기 대단하고
남에서 북에 오기 / 백 리나 거의 하되
여염이 빈틈없어 / 담뿍이 들었으며
한가운데 낭화강이 / 남북으로 흘러가니
천하에 이러한 경치 / 또 어디 있단 말고.
— 「구리 기와 즐비한 도시」 중에서
야만인 오랑캐라 생각했던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다. 김인겸은 이러한 일본의 발전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하늘을 원망하며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화려하게 장식한 일본 배를 묘사하거나(「용과 봉황을 아로새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본 오오사카의 야경에 황홀해하고(「삼신산의 금빛 궁궐」), 나고야의 사치스러운 가옥과 아름다운 여인에 감탄하는(「황홀한 나고야 여인」) 등 『일동장유가』의 곳곳에서 일본의 번영과 발전상을 보고 놀라는 김인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김인겸은 일본이 번영을 누리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을 개돼지에 비유하면서 이들을 모두 소탕하고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조선 왕의 교화로 예의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아무것도 모르는 천황」). 유교 문명을 지향하는 의식은 당시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한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문명 의식’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위’(武威)이다. 김인겸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이유는 당시 일본이 조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무사(武士)가 지배하는 ‘무가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명 의식이 일본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게 한 것은 아니다. 조선과 일본의 문사들은 한문과 유학을 매개로 상호 소통할 수 있었다. 통신사가 숙소에 도착하면 일본 문사들은 통신사를 만나 자신이 지은 시문을 보여 주고 비평을 구했으며, 제술관과 서기는 이들을 상대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중에는 김인겸을 스승으로 섬기고 싶어 한 이도 있었다.
한편, 김인겸은 일본의 발전상과 기술력에 놀라면서도 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는 조선에서 볼 수 없는 기물이 나타나면 유심히 관찰하여 그 모양과 쓰임새까지 상세히 기술하였다. 길가에서 본 물레방아에 흥미를 느껴 말에서 내려 관찰한 후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신기한 물방아」), 거대한 수차가 자동으로 성안으로 물을 퍼 올려 백성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한 글이나(「편리한 수차」), 쓰시마 사람들이 구황 식물로 먹는 고구마를 일부러 사서 먹어 보고 조선에 보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글(「효자 토란」) 등에서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실제 계미사행 때 정사(正使) 조엄(趙曮)이 고구마 종자를 일본에서 들여와 재배에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계미사행의 일원인 실학자 원중거와 성대중의 사행록에도 고구마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통신사행원들이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동장유가』에 단편적으로 보이는 실학적 관심 역시 실학파인 성대중, 원중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 최천종 피살 사건
『일동장유가』에는 최천종 피살 사건이 꽤 많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통신사 일행이 일본인에게 살해당한 일은 통신사가 파견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초유의 비상 상황이었다.
1764년 4월 7일 새벽, 오오사카에 머물고 있던 통신사의 숙소에 누군가 몰래 들어와 자고 있던 최천종의 목을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최천종을 찌르고 달아나던 범인이 조선인의 발을 밟고 넘어짐으로써 범인이 일본인임을 알 수 있었다. 통신사는 출발을 연기하고 쓰시마 번에 사건 해결을 요구하지만, 어쩐 일인지 쓰시마 번의 대응은 미온적이기만 했다. 4월 13일, 쓰시마의 통역관 스즈키 덴조오가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졌고 체포령이 내려졌다. 4월 19일, 셋츠 지역에서 마침내 스즈키 덴조오가 붙잡혔다. 심문을 거쳐 4월 29일, 마침내 스즈키 덴조오의 사형이 결정되었다. 5월 2일, 통신사 일행 54명이 배석한 가운데 스즈키 덴조오가 처형되었다.
쓰시마 번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내내 최천종이 스스로 자결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거나 시신이 담긴 관을 내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통신사의 분노를 샀다. 덴조오의 심문 과정에서 밝혀진 살해 동기는 개인적인 원한이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진상은 알 수 없었다.
김인겸은 오히려 인삼 밀매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김인겸은 『일동장유가』와 함께 한문 사행록인 『동사록』(東槎錄)도 썼는데, 이 책에는 통신사 비장(裨將)인 이매(李梅)와 역관들이 서로 짜고 일본의 고위 관료에게 줄 인삼을 몰래 빼돌려 팔았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입막음을 위해 최천종을 살해한 것이라는 내용이 보인다.
김인겸은 최천종 살해 사건을 일화와 대화체를 섞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이런 서술들로 인해 김인겸이 만난 일본인들의 면면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일본에서 겪은 사건들이 더욱 현장감 있게 다가온다. 『일동장유가』가 다른 사행록과 달리 다채롭고 흥미진진하게 읽히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
(1) 이 책은 한양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가는 국내 부분은 제외하고, 부산에서 출발해 에도까지 간 뒤에 다시 에도에서 출발해 귀국하는 기록만 담았다. 『일동장유가』는 일기처럼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여정에 따라 시간순으로 배열하였다.
(2) 『일동장유가』의 원문은 고어와 한자 어구 등이 많이 섞여 있어 지금 독자가 읽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원문을 현대 문법에 맞게 고쳐 쓰되 가사의 율격이 지닌 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한자 어구는 우리말로 바꾸는 대신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3) 원문에는 단락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절하게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과 해설을 붙였다. 한 단락 안에서도 너무 길거나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은 한 행을 띄워 구분했다.
(4) <1763년 통신사의 여정> 지도를 수록해 통신사행의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수능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작품인 만큼, 상세한 해설과 김인겸의 연보를 수록하여, 누구나 『일동장유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
간행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1장 장쾌한 사행길 – 부산에서 쓰시마까지
장쾌한 사행길 / 구만리 우주에 뜬 배 / 이를 검게 물들인 여인 / 삼 층 찬합에 담긴 음식 / 효자 토란 / 사이후쿠지(西福寺)의 금부처 / 수천 냥짜리 이불 / 예법을 모르는 승려 / 사신과 쓰시마 도주의 만남 / 기 구니아키라(紀國瑞)라는 인간 / 가이안지(海岸寺) 구경 / 옻칠 가마 / 정성스러운 음식 교환 / 쓰시마의 연회
2장 전설이 서린 땅 아카마가세키 – 쓰시마에서 오오사카까지
귀신이 요동치는 바닷길 / 간사한 조선 마두 / 전복을 먹지 않는 이유 / 기녀의 유혹 / 글 받으러 몰려드는 일본 문사 / 충절이 깃든 하카타(博多) / 하루 음식 값이 만 냥 / 인간 가메이 로오(龜井魯) / 전설이 서린 땅 아카마가세키 / 유곽 / 벼랑 위의 금각 / 아카시(明石)에서의 달구경
3장 용과 봉황 아로새긴 배를 타고 – 오오사카
용과 봉황 아로새긴 배를 타고 / 삼신산의 금빛 궁궐 / 무지개다리 / 법령이 엄한 나라 / 눈요기 잔칫상 / 구리 기와 즐비한 도시 / 해괴한 결혼 풍습 / 밤낮으로 지어 준 시
4장 아무것도 모르는 천황 – 교오토에서 에도까지
편리한 수차 / 아무것도 모르는 천황 / 제자 되길 청하는 가츠야마(勝山) / 홀로 남겨진 밤길 / 배다리 / 황홀한 나고야 여인 / 금덩이 내버린 금절하(金絶河) / 하코네(箱根)에서 보는 후지 산(富士山) / 깊고 푸른 하코네 호수
5장 후지 산의 만년설 – 에도
에도 막부 / 나바 로도오(那波魯堂)와의 만남 / 국서를 받들고 오른 에도 성 / 진중치 못한 쇼군 / 에도 성의 연회 / 회답서 수정 요구 / 눈물로 전송하는 일본인들 / 신기한 물방아 / 후지 산의 만년설 / 세이켄지(淸見寺)의 뒤뜰 / 주먹만 한 밤알
6장 최천종 살해 사건의 전말 – 오오사카
최천종(崔天宗) 살해 사건의 전말 / 살인범 스즈키 덴조오(鈴木傳藏) / 쓰시마의 책임 회피 / 가짜 범인 처형식 / 역관의 밀무역 / 고국을 눈앞에 두고
해설
김인겸 연보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