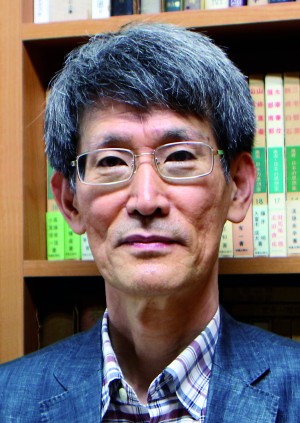서문, 책의 안과 밖
| 발행일 | 2025년 11월 24일 |
|---|---|
| ISBN | 9791194442585 03800 |
| 면수 | 299쪽 |
| 판형 | 변형판 135x210, 양장 |
| 가격 | 35,000원 |
책의 완성 뒤에 서문이 첨부되는 것이 아니라,
서문을 기다려 ‘비로소’ 책이 완성되고 끝난다.
이 책은 박희병 교수(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가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0여 년 동안 발표한 총 25권의 저서와 다수의 번역서, 편집서의 서문을 모두 모은 ‘서문 모음집’이다. 박희병 교수의 ‘서문’은 독립된 한 편의 작품으로 읽어도 될 만큼, 정확하고 유려하다.
서문은 책의 ‘안’인가 ‘밖’인가
책을 펼쳐 제일 먼저 만나는 글이 서문―다른 이름으로는 ‘책을 펴내며’, ‘책머리에’, ‘시작하며’ 등―이다. 서문의 내용은 책의 성격에 따라, 저자에 따라 다르다. 보통 서문에는 책을 쓴 경위와 목적, 책의 주제 등이 언급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의 집필이나 출판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말이 나온다. 즉, 서문은 매우 형식적인 글이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문은 책 ‘밖’의 글이고, 이 경우 서문은 8할 이상이 저자를 위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독자는 어떤 서문을 읽고 싶을까? 만약 독자가 엄청난 내공의 학술서를 읽으려 한다면, 서문에서 잠시 저자의 ‘사유’를 엿보고 싶을 것이다. 앞으로 읽게 될 방대한 혹은 깊은 글들을 만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저자의 ‘사유’가 담긴다면 서문은 책 ‘안’의 글이고, 독자를 위한 사색의 공간이 될 것이다.
서문은 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책의 ‘안’이다. 이 점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책의 편집 상태에서 쉽게 확인된다. 서문은 책 표지의 안쪽, 즉 책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서문이 끝나면 책의 목차가 나오고, 이어서 책의 본문이 시작된다. 이 점에서 서문은 ‘본래적 책’과는 구별되며 그 바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문, 책의 안과 밖’이라는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박희병 교수는 서문이란 ‘책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책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서문 글쓰기는 책 전체를 부감(俯瞰)하면서 그 방향성을 정위(定位)하기도 하고, 그 한계를 정시(呈示)하기도 하며, 그 의의를 포착해 제시하기도”(16면)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서문들은, 모두 ‘책의 안인 동시에 밖인’ 서문의 독특한 존재 특성을 보여 준다.
학술서를 쓰는 저자라면, 책 안에서 저자는 철저히 학자로서의 페르소나를 견지한다. 이 때문에 학자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실존이나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는 억제된다. 하지만 책 밖의 존재인 서문에서 저자는 이제 꼭 학자로서의 페르소나에(그것도 특정한 주제와 연계된) 갇힐 필요가 없으며, 학자와 한 인간으로서의 페르소나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즉, 저자는 책에서 학자로서의 페르소나로 인해 말하지 못했던(말할 수 없었던) 것을 서문에서는 말할 수 있다. 서문이 책의 본문과 달리 메타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은 이 때문이다. 서문에서는 이처럼 두 개의 페르소나로 인해 저자는 자유롭고 진솔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다. 또한, 자기 내면의 고뇌를 토로할 수도 있고, 학문을 하는 실존적 고민을 하소연할 수도 있다.
저자가 자신의 학문 도정을 되돌아보며 이 책이 자신의 학문 행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톺아보거나, 자신이 속한 학문 지형 속에서 책의 성과를 객관화할 수 있는 것도 서문이라는 글쓰기가 책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책의 밖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자의 학문의 궤적을 보여 주는 서문집
책의 서문을 추려서 본서와 같은 ‘서문 모음집’을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서문이 책의 안과 밖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박희병 교수가 그간 써 온 저서와 번역서, 편집서의 서문 및 발문, 그리고 기타 원고로 구성되었다.
본서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박희병 교수가 한국학 연구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자로서 품어 온 이상과 가치 지향, 고뇌와 분투가 무엇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나는 나의 책 서문에서, 기존의 학문적 담론 지형 속에서 이 책이 뭐가 새로우며 무슨 창안을 이룩했는가, 이 책에 담긴 내 정신의 운동 과정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고민에서 책을 썼고 어떤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책을 썼는가, 나는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으며 어떤 모색을 꾀했는가, 내가 논한 주제와 그 논의 방식이 한국의 학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등등에 대해 언급하거나 물었다. 그 결과 내가 쓴 서문들은 각각 그 당시 내 공부의 진척 정도와 내 공부의 지향점, 나의 학문적 고민과 의제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그것은 내 공부길의 이정표요, 글을 쓴 바로 그때의 ‘나’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_「자서 1 서문집을 내며」 중에서
박희병 교수는 서문이 “내 공부길의 이정표요, 글을 쓴 바로 그때의 ‘나’”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서문집’이되, 한편으로는 일평생 학문 연구에 헌신해 온 한 인문학자의 ‘자서전’으로 읽힐 측면도 있다.
박희병 교수가 말했듯 오늘날의 인문학자는 “폐허에서 사유하는 난민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젊은 인문학도들에게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이 책에 종합적으로 담긴 박희병 교수의 학문적 궤적이 오늘의 인문학도와 내일의 인문학자에게 소중한 길라잡이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 책의 말미에 수록된 문학평론가 권성우 교수(숙명여대)의 발문 「경계인의 올곧은 자의식과 사유의 힘-박희병의 글쓰기를 생각하며」를 통해 “학문적 글쓰기와 비평적 글쓰기의 조우”(6면)가 이루어진 점도 주목된다.
현대문학 연구자인 권성우 교수는 박희병 교수의 연구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스스로 발문이 아닌 ‘비평 에세이’라 겸사하지만, 권 교수는 발문을 통해 박희병 교수의 학문적 태도와 글쓰기의 특징을 정리했다. 권 교수는 박희병 교수의 글에 대해 학문적 글쓰기에 그치지 않고 문학적 조망과 비평적 접근이 필요한 문학 텍스트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 책의 구성
_ 본서는 박희병 교수가 그간 출간한 책의 서문 및 일부 발문과 수상 소감 등을 모은 ‘박희병 교수 서문집’이다.
_ 본서는 제1부 저서, 제2부 번역서, 제3부 편집서, 제4부 기타로 구성되었다.
_ 본서에 실린 글 중 제일 이른 시기의 것은 1982년 7월 29일에 쓴 『벗이여, 흙바람 부는 이곳에—박병태 유고집』의 서문이고, 가장 최근의 것은 2024년 5월 30일에 쓴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의 서문이다. 전체적으로 학술서에 쓴 서문이 가장 많고, 번역서에 쓴 서문이 그다음으로 많다. 저서나 번역서는 아니지만, 저자가 직접 편집한 책들 몇 권의 서문도 실었다. 또한 ‘수상 소감’ 2편과 취지문 1편도 함께 실었다.
_ 『우리가 우리에게-오늘 땀흘리며 일하는 우리들의 노래』(돌베개, 1985)와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80년대 노동자 생활글 모음』(돌베개, 1986)은 1980년대 ‘노동자 문학 선집’으로서 의의를 지니는 책이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저자를 편집부라고 표기하였지만, 청년 시절에 박희병 교수가 두 책의 기획 및 편집을 주도하고, 그 서문을 쓴 사실을 이 책에서 처음 밝힌다. 이 책의 제3부 ‘편집서’에 두 책의 서문이 실려 있다.
기획자의 변(辯)
자서 1 서문집을 내며
자서 2 서문은 책의 ‘안’인가 ‘밖’인가
제1부 저서
1. 한국고전인물전연구
2. 조선후기 전(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3. 한국한문소설
4.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5. 선인들의 공부법
6. 한국의 생태사상
7. 운화와 근대
8.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9. 연암을 읽는다
10. 연암산문정독
11. 거기, 내 마음의 산골마을
12.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13. 저항과 아만
14. 연암산문정독 2
15. 연암과 선귤당의 대화
16. 나는 골목길 부처다
17. 범애(汎愛)와 평등
18.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 1・2
19.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20. 18세기 통신사 필담 1
21. 통합인문학을 위하여
22. 엄마의 마지막 말들
23. 능호관 이인상 연보
24. 한국고전문학사 강의 1・2・3
25. 김시습, 불교를 말하다
제2부 번역서
1. 나의 아버지 박지원
2.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3.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기
4.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5. 우리고전 100선
6. 말똥구슬
7. 천년의 우리소설
8. 골목길 나의 집
9. 종북소선(鐘北小選)
10. 능호집
11. 절화기담, 순매 이야기
12. 포의교집, 초옥 이야기
제3부 편집서
1. 벗이여, 흙바람 부는 이곳에
2. 차라리 밤을 기다리며
3. 노신(魯迅) 선생님
4. 우리가 우리에게
5.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제4부 기타
1.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2. 민족문학사연구소 창립 취지서
3. 성산학술상 수상 소감
4. 나의 첫 책
5. 도남학술상 수상 소감
발문 / 경계인의 올곧은 자의식과 사유의 힘– 권성우
서문 중 감사의 말에 언급된 분들